주낙현 신부와 함께 하는 전례 여행
성찬례의 인간 - 전례와 사회
교회와 사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파는 이 질문에 다양하게 답하고 행동했다. 교회는 세속 사회에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와 종교 권력을 저항하고 비판하다 희생당하신 분이므로 사회에 대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당연히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장도 그에 못지않다. 교회의 사회 참여를 둘러싼 논란은 그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이 일로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일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례 전통에 충실한 성공회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성공회는 그 질문을 좀 다르게 던진다. 교회의 중심 행동인 전례는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사건, 함께 모여서 그 축성된 몸을 먹고 나누는 우리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성공회 신자는 전례의 사건 속에서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살피려 한다.
‘말씀’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그리스도이시다. 성서는 ‘말씀이신 하느님-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그릇이다. 적어도 전례 전통의 교회에서는 ‘말씀의 전례’에서 읽는 성서 독서를 성직자나 신자 개인의 호불호나 멋대로 선택하지 않는다. 세계 여러 교회가 함께 연구하여 지정한 정과표를 따른다. 좋든 싫든 성서에 드러난 말씀을 그대로 듣겠다는 뜻이다. 나를 비판하고 호통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다. 그 말씀이 사회를 향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피하고서는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라 말하기 어렵다.
모든 전례의 목적은 변화이다. 특히 성찬례는 그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낸다. 전례 참여의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제대 앞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우리의 땀과 수고, 우리의 잘못과 상처, 우리의 기쁨과 슬픔, 결국 세계 전체를 제대 앞으로 가져온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세계 전체를 상징한다.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은 이 세계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축성이다. 이 변화의 사건을 믿지 않고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영성체는 세계 전체가 제대 위에 바쳐져서 거룩하게 변화된 것을 나누어 먹는 행동이다. 우리는 그 변화의 결과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 몸과 영의 에너지와 피가 되어 우리 몸을 돌아다닌다. 새로운 몸과 피를 받았으니 우리 자신도 변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몸을 돌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거부반응을 일으켜 몸이 굳고 더는 살아갈 수 없다. 게다가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여럿이 나누어 먹었으니, 교회를 떠나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는 세계와 사회도 우리를 통해서 변화와 나눔의 은총이 일어나야만 한다. 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에 비추어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 자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영성체’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적어도 성공회 전통은 우리가 전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만큼, 사회도 그렇게 변할 수 있으며, 변해야 한다는 희망을 고수했다.
“그리스도인은 전례를 통해서 ‘경제적인 인간’(homo economicus)이나 ‘소비적인 인간’(homo consumericus)이기를 포기한다. 대신 ‘성찬례의 인간’ 즉 ‘나눔의 인간’(homo eucharisticus)으로 변화된다.” 지난 세기 최고의 전례학자 그레고리 딕스(Gregory Dix) 수사 신부의 말이다.
이것이 전례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룩한 변화의 진정한 뜻이며, 전례가 비추는 사회의 비전이다.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신의 성막을 나와, 우리 안에 신비하게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의 거리로 걸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도시와 마을 사람들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빈민촌에 머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막에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노라 할 수 없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바쳤던 선교사 프랭크 웨스턴 주교의 외침이다.
이런 고민과 전통을 돌아보며, 우리는 우선 교회와 전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신실하게 물어야 한다. 전례 안에서 읽고 듣는 예언자적인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귀와 마음을 열어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가? 사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갈등과 아픔을 제대 위에 봉헌하는가? 하느님께서 그 세속적인 것들을 축성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몸으로 나누어 주실 때, 거리낌 없이 우리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가?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자신도 그 몸을 모시고 세상 밖에 나가 세계와 사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실천하는가?
(성공회 신문, 2011년 12월 2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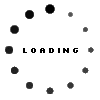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