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현 신부와 함께 하는 전례 여행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 전례와 몸의 감수성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하던 시절. 어머니가 조개껍데기 모양의 예쁜 마들렌 케이크를 주셨다. 기력이 빠진 나는 마지못해 입을 열고 마들렌을 적신 차를 조금 맛보았다. 케이크 부스러기가 섞인 따뜻한 차가 입천장에 닿자마자 나는 몸서리 쳤다. 갑자기 그 맛이 기억났다. 그리고 거리 위쪽의 오래된 잿빛 집이 작은 현관과 분리된 무대처럼 우뚝 치솟았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긴 소설을 다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병상에서 그가 맛본 작은 마들린 케이크와 홍차의 향기가 잊고 있었던 오랜 기억을 새롭게 살려주었다는 이 대목쯤은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다.
이 경험에 공감했는지 심리학자들은 냄새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실험으로 밝혀내기도 했다. 그리고는 맛과 따뜻함에 묻어난 냄새가 기억을 상기하는 현상을 ‘프루스트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교회 전통을 통해서 보았더라면, ‘전례 효과’라 고쳐 불렀을지도 모른다. 교회는 몸의 다섯 가지 감각(오감)이 모두 작동하는 전례를 거행하면서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전례적 교회는 몸의 오감을 총동원하여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되살리고, 되살린 기억에 따라 내일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교회이다.
우리 몸의 오감이 전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한다.
시각: 예배를 드리러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간은 그 시각적 초점이 분명하다. 아무리 크고 찬란한 성당이라도, 전세살이하는 작은 교회라도, 우리 시선의 초점은 중앙의 제대로 모인다. 오랫동안 십자가를 시선의 중심으로 여기기도 했고, 스테인드글라스나 멋진 성화에 눈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러나 전례 공간의 중심은 제대이다. 그 제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촉각: 많은 교회는 입구에 세례대(성천)나 작은 성수대를 마련하여, 성당에 들어오는 신자가 손을 적셔 세례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돕는다. 손끝에 묻힌 물의 촉감은 이마로 이어져서 온몸에 십자성호를 긋고, 이전에 받은 세례의 은총이 우리 몸에 물처럼 부어졌음을 되새겨준다. 세례받지 않은 새신자라도 거룩한 물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한다는 다짐을 한다.
후각: 많은 성공회 신자에게 전례의 냄새는 유향을 피우는 냄새이다. 다양한 꽃의 향과 나무의 진액을 뽑아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체로 만든 유향은 우리 인간의 고된 노동을 상징하거니와, 우리 기도를 하늘에 올리는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예배드리는 공간과 성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정화하고 드높인다는 다양한 뜻을 지닌다. 이런 해설 이전에 그 냄새는 우리를 아늑한 어떤 기억으로 데려간다.
청각: 전례 공간에서 울리는 다양한 소리는 우리의 청각을 자극한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신자들의 목소리, 악기 연주, 그리고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 귀에 꽂히는 성서의 말씀과 설교자의 음성, 또 집전자와 신자들의 모든 음성이 청각에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나누는 다정한 잡담마저도 우리가 공동체요 한 식구인 것을 되새겨 준다.
미각: 대체로 미각은 후각과 함께 작동한다. 영성체에서 맛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말 그대로 우리 몸속 깊이 흘러들어 우리 신앙의 기력을 만든다. 우리 노동의 상징이며 우리 봉헌의 표지이고,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 희생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을 내 몸의 혀로 맛보며 목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러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전례가 진정한 전례이다. 설령 개인의 신체적인 처지에 따라 몇몇 개별 감각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이런 감각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알고, 다시 전례와 일상에서 몸으로 느끼는 훈련을 거듭할 때 전례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다. 전례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오감을 넘어선 육감의 전례를 드릴 수 있다. 이제 전례는 육감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례적 감수성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은 뒤, 사물이 부서지고 흩어진 뒤, 과거의 먼 시간을 거치며 살아남는 것은 없다. 다만, 맛과 냄새만이 살아남을 터이니, 어쩌면 그것은 더 미약한 것일지언정 더 오래가며, 더 불확실할지언정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욱 신실한 것이어서, 오랫동안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은 영혼처럼, 모든 것들이 남기고 간 폐허 속에서도, 기억하고 기다리고 희망하며 버티는 힘이다. 어떤 위협이나 유행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작고 미세한 한 방울의 힘이 바로 모든 기억의 광대한 구조를 지탱한다” (마르셀 프루스트)
이것이 감각을 통한 기억의 감수성이며, 우리 전례가 지향할 영적인 몸의 감각, 즉 교회의 감수성이다.
(성공회 신문 2011년 10월 8일,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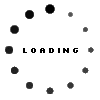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