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현 신부와 함께 하는 전례 여행
성사와 성사성 - 하느님 은총의 통로
이번에는 ‘성사’를 둘러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하나는 그 다양한 뜻풀이와 쓰임새, 그리고 원칙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사의 개수를 관한 것이다.
1) 십몇 년 전 신학교 교실 풍경
교수 신부님은 뜬금없이 “성사(聖事: sacrament)란 무엇이오?”하고 신학생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맥락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신학생들은 이런저런 단답형 대답을 내놓았다. 신부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옆자리로 연이어 한 사람씩 물으셨다. 어느 동료의 대답이 기억에 남는다. “말 그대로, ‘거룩한(聖) 일(事)’입니다.” 신부님은 한숨을 쉬셨고,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잘못된 대답이었을까?
사실 신부님이 원하시던 답은 “성사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5세기 히포의 성 어거스틴 이후로 정해진 모범 답안이다. 그러나 이 오래된 개념 정의를 내놓지 않은 학생들을 탓해야 할까? 실제로 이 답을 학생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성사’라는 말은 그 맥락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인다. 학생들의 여러 단편적인 생각을 모아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연결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교수법이 아니었을까?
‘성사’라는 말이 우리말로 전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다. 성사를 지칭하는 성서의 원래 낱말은 ‘미스테리온’(신비)이다. 이 말이 라틴어로 ‘사크라멘툼’(맹세)으로 번역되었다. 다시 이 말은 한자어를 조합한 우리말 ‘성사’(거룩한 일/것)가 되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적 성사라고 한다. 더 나아가 최근의 성사신학은 하느님의 은총이 물질로 세상에 드러난 ‘창조’ 사건으로 근원적 성사를 확장한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창조 세계와 참인간인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도록 드러났다. 이것이 성사의 원칙, 즉 성사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는 성사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하게 썼다. 넓게는 성찬례가 성사 자체이며, 좁게는 성체(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성사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총과 서약의 예식인 세례도 성사이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겪는 중요한 고비들을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계기와 통로로 보고 그 예식을 점차 성사라 불렀다. 견진, 고해, 혼인, 조병, 성직서품이다. 그 계기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듬뿍 내려 축복하셨으니 모두 ‘거룩한 일’이다.
2) ‘7’ 성사와 ‘2’ 성사
그리스도교는 서로 나뉘어서 자기 전통에 따라 발전했기 때문에, 성사의 개수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많다. 이런 우스개가 흔히들 오간다. “천주교는 7성사, 개신교는 2성사(세례와 성찬례), 성공회는 천주교인 앞에서는 7성사, 개신교인 앞에서는 2성사.” 이런 말이 마뜩잖다면, 우리 기도서에서 구분한 ‘두 개의 성사’와 ‘다섯 개의 성사적 예식’도 마찬가지일 성 싶다. 한편, 천주교 여성 신자는 이런 우스개를 던지기도 한다. “남자에게는 7성사, 여자에게는 6성사." 여성성직을 거부하는 천주교에 대한 자조 섞인 비아냥이다.
한편, 정교회 측의 답변은 우리 생각을 더 넓히라고 제안한다. “우리도 7성사. 세례와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사이며, 다른 다섯 개의 예식도 당연히 성사.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이 7개의 성사에 그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지금도 펼치시어 우리에게 드러나고 경험하는 은총이 모두 성사가 아닌가?” 이 셈법에 따르면, 성사는 아브라함이 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별의 수 만큼이나 많다. 성사가 몇몇 구체적인 예식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좁게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이겠다.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는 지금 이 경고를 깨닫고 있다.
20세기 전례학의 거두 제임스 화이트(감리교)는 개신교 신학의 미래가 성사성에 대한 감각의 회복과 그 실천에 달려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서 풍요로운 성사적 삶을 막고있는 장애물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성사를 하느님의 현존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하느님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기억으로만 보려는 태도이다. 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리하는 사고 방식에 물들어, 성사 안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기 어렵다.
둘째, 최근에 일어나는 위협 가운데 하나는 몇몇 교회 성장 운동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성사과 교회력, 그리고 성서정과가 우리 문화에 적절하지 않고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를 밀어내려 한다.
셋째, 생각없이 대충 성사를 집전하는 것도 풍요로운 성사적 삶을 막는다. 준비없이 드리는 성찬례와 성사는 그 안에서 이뤄지는 하느님과의 사귐이라는 신앙을 약화시키고 파괴한다. 여러 성사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성사에 대해 무지한 세대가 되어 버렸다.
다행히,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성공회 신문, 2011년 8월 24일치,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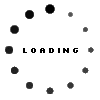
댓글0개